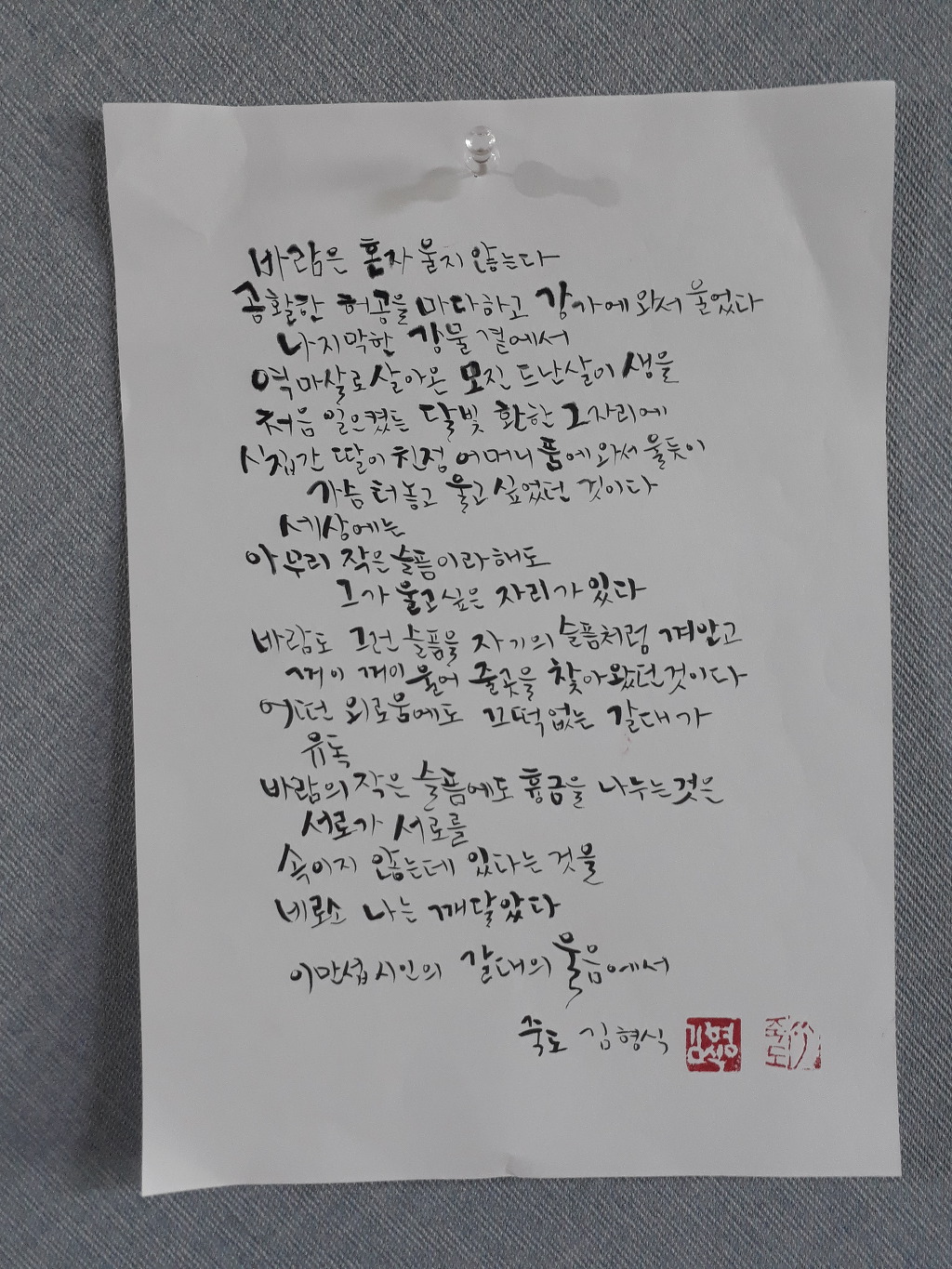그루터기 , 이만섭,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신작 5편 중 한 편
나무는 죽어서 풍장을 치른다 밑동이 잘린 채 뺏속 깊이 생의 이름을 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무라는 말로서 그 이름을 대신한다면
굳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할까, 생을 움켜쥐고
수원지를 찾아 해매던뿌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땅속 깊이 박힌 채 몸의 중심부에서 여전히 무슨 소식이 오길 시다리는 것은 아닐까
배인 밑동은 깊은 고뇌에 들었다
살아 잎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건만
수액을 나르던 등걸은 잘려나가고 화살의 과녁처럼 나이테만 동그마이 남았다
그 표적에 앉아 월의 출구 쪽으로귀를 연다 똑, 똑, 석회암 동굴에서
종유석을 키우는 물방울 소리, 오랜 세월 풍찬 노숙으로 키운 얼마나 애써온 생인가,
생명을 지키던 가쁜 숨소리가 전류를 머금은 코일처럼 찌릿찌릿 감겨온다
생을 그리 내주고도 표정은 이처럼 담담할까,
누구나 삶의 단층을 들려다보면 그곳에 생이 지니고 온 지도가 혈류처럼 간직되어 있다
더 굵게 더 광활하게 그러니까 생은 둥글기 위해 살았던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자라서 베어질 때까지 평생토록 하늘을 향해 생명의 문장을 써온 것이 그 이유라면
이제 몸의 가장 낮은 자리에 중심을 내려 저렇게 나이테만 남기고 피안에 들었다
나무가 생의 이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