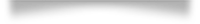발목 잡힌 새



분홍빛 상사화

영춘화 소근소근 봄소식


두리번 두리번 해거름 비둘기

벌막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해 늦 가을까지 꽃을 피우더니만 탐스럽게 봄을 연다

억새 한 송이 얘는 올봄도 혼자다

이름 모른 새 싹이다 무슨 꽃을 피울지 기대해보자


봄 찾아 동네 한 바퀴
그나마 추위가 떠나고 며칠 따뜻했다고
오후의 공원 길이 만원이다
의자도 빈 곳이 없어 아무 곳이나 앉았더니
빈 나뭇가지에 푸덕거리는 것이 있다
설마하니 새이려고 그러나 정말 새가 매달렸다
하늘을 나는 새가 한치 앞을 못봤는지 발목이 묶여
대롱대롱 살아서 퍼덕거리는지 바람에 대롱거리는
내 눈으론 분간이 안된다
내 마음이 왜 이토록 슬플까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날개는 뒀다 뭣에 쓰려고
봄이라고 했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장의자를 차지하고 앉은 노인이 연신 대허공에다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
멋쟁이 모자도 쓰시고 썬그라스도 착용했는데 마스크는 무마스크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건가 아니면 술에 취하신 건가
나의 발걸음은 행단보도를 건너 공원으로 향했다
벌막공원엔 영춘화와 상사화가 재일먼저 봄을 알리는데
역시나 반겨준다 아직 눈은 안 떴지만 영춘화는
빗물 먹으면 뜨겠다고 작은 소리로 알려줘 며칠 후에 보자며
어두워지는 동네 한 바퀴 골목길을
돌아왔다.

 봄볕 좋은 날 동네 한 바퀴
봄볕 좋은 날 동네 한 바퀴
 첫봄 3월 첫날 동네 한 바퀴
첫봄 3월 첫날 동네 한 바퀴